|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북트레일러
- 신체설계자
- 뒤센형근위축증
- 키메라연구
- 유전자가위
- 크리스퍼카스9
- 스파르타코딩클럽
- 애덤피오리
- 책리뷰
- Hypemachine
- 올가토카르추크
- 관심경제
- 호모데우스
- 분자생물학
- 북리뷰
- 시난아랄
- 신체증강
- 근위축증
- 은하수를여행하는히치하이커
- 2018노벨문학상
- 유튜버
- 해달책방
- 방랑자들
- 빡빡이아저씨
- 초사회화
- 데이터보호
- 유발하라리
- 하이프머신
- 북튜버
- 히치하이커를위한안내서
- Today
- Total
해달책방
크리스퍼카스나인 유전자가위는 키메라 연구에 어떻게 쓰일까? │과학│유전공학│biology│CRISPR│Technology 본문
크리스퍼카스나인 유전자가위는 키메라 연구에 어떻게 쓰일까? │과학│유전공학│biology│CRISPR│Technology
SEA OTTER'S BOOKSHOP 2019. 5. 22. 15:52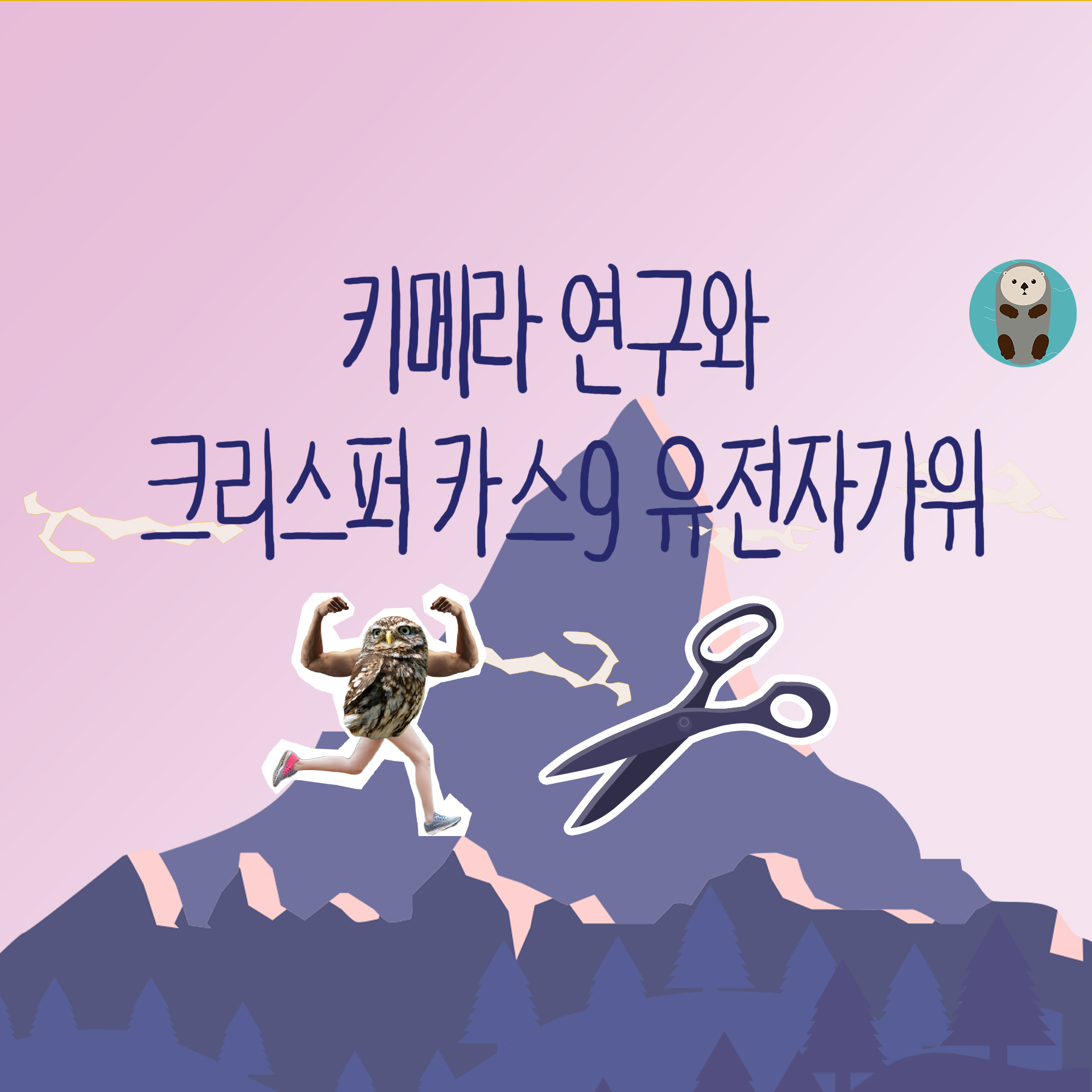
고대그리스 터키 남동해안의 도시 리키아의 산에서는 항상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려왔다.
독사, 염소, 사자가 있는 이 산을 보고 사람들은 꼭대기에 사는 괴물의 이름을 따 키메라산이라고 불렀다.
키메라는 참으로 이상하게 생긴 동물이었다. 사자 머리, 염소몸통, 독사꼬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간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산을 태우던 키메라는 고대엔 썩 환영 받지 못하는 존재였다.
그럼 지금 키메라는 어떤 의미일까?
키메라는 머리와 몸통이 다른 생물 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현대 생물학에서는 어떤 생물의 유전자 일부를 다른 생물의 유전자에 삽입해서 이식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2016년 미국국립보건원 NIH에서는 일반적인 이종 장기 이식수술 방법이 아닌, 돼지의 장기배아를 이용한 키메라 장기이식 연구에 주목하였다. 이들은 인간-돼지 키메라 연구에 미국정부의 지원을 승인하였다.
불과 1년 전인 2015년, NIH는 사람의 지능을 능가하는 돼지 키메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의식하여 인간-돼지 키메라 연구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였다.
그렇다면 왜? 미국 NIH는 1년 만에 인간-돼지 키메라 연구 모라토리엄 선언을 뒤집었을까?
키메라의 연구가 재개 된 가장 큰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이식용 장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의료계에서는 인간-돼지 키메라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과 미국 모두 장기이식 대기환자수에 비해 기증자 수가 현저히 적은 상황이다. 미국에서는 매일 22명이 장기이식을 받지 못해서 사망하고 있다.
돼지는 다른 포유 동물들에 비해서 ‘생리’와 ‘장기’의 형태가 인간과 가장 유사하다.
하지만 돼지의 장기를 그대로 인간에게 이식하면, 치명적인 동물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고, 사람의 몸은 격렬한 면역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면역거부 반응없이 돼지의 장기를 이식할 수 있을까?
현대 생명공학은 크리스퍼 카스9 유전자 가위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듯 하다. 크리스퍼 카스9 유전자 가위는 RNA와 DNA의 하이브리드인 인공 효소다.
크리스퍼 카스9 유전자가위의 RNA가 질병을 일으키는 DNA 염기서열을 찾아내고, 유전자가위효소인 DNA 가위가 이를 잘라내는 식으로 작동한다.
다만 의도하지 않은 염기서열을 잘라내는 현상인 표적이탈을 해결할 방법이 뚜렷하지 않아, 현실에서 사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였다.
그러던 중 올해 2018년 4월, 서울대와 앨버타 대학교의 연구진들은 유전자 가위의 정확도를 1만배 이상 높였다는 연구결과를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서 밝혔다.
이들은 안내자 RNA 중 일부를 가교핵산로 바꿔서 실패확률을 낮췄다.
면역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내인성 레트로 바이러스 제거가 끝나면 키메라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우선 한달 정도 된 돼지의 배아에서 특정 장기를 만드는 DNA를 추출한다.
장기가 필요한 환자의 피부세포를 이용하여 역분화 배아줄기 세포를 만든다. 역분화배아줄기세포는 특정 장기를 표적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도만능줄기세포라고 부르기도 한다.
환자의 역분화배아줄기세포를 돼지의 배아에 삽입한다.
돼지의 배아를 대리모 돼지의 자궁에 착상시키면 인간-키메라 돼지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 돼지는 근육과 장기에서 사람의 세포를 키워내 특정 장기를 자라나게 한다.
돼지에게서 자라난 장기를 환자에게 이식하면 모든 과정은 끝이 나게 된다.
실제로 2017년 8월 중국 후난성에서 한 실명 위기의 청년이 돼지 각막을 이식 받고 시력을 거의 회복했다. 중국이 미국보다 1년 빠른 2015년 이미 돼지의 각막이식을 정식 승인 한 덕분이다.
앞으로 다른 키메라 장기들도 크리스퍼 카스9 유전자가위의 도움으로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시간이 더욱 앞당겨 질 전망이다.
인간의 배아를 이용한 과거의 연구는 생명윤리적으로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과학계는 새로운 기술들 덕분에 예전에 비해 윤리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워졌다.
인간-키메라 연구에 사용된 기술들은 과연 완벽할까?




